농구/NBA
유재학호 성장 딜레마, 대표팀·KBL 환경차이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딜레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최근 일본, 브리검영대와 5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각종 전술의 숙련도를 더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었다. 단순히 한국농구가 국제무대서 힘과 테크닉이 달린다는 걸 체감했으니 쉽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성장의 딜레마’가 있다.
대표팀이 국제무대서 추구하는 농구, 그리고 KBL 10개구단이 국내리그서 추구하는 농구는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게 한국농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 행정적인 지원 등이 어울려야 한다.
▲ 수비 딜레마
기본적 맨투맨 수비에 이은 스위치 디펜스. 대표팀과 KBL 10개구단이 진행하는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대표팀은 4~5번 포워드와 빅맨들까지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나와서 스위치를 진행한다. 팀별로 차이가 있지만, KBL 구단들은 빅맨들에게 외곽수비를 거의 지시하지 않는다. 빅맨들이 외곽에서 수비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선수들인데, 골밑에서 자신의 기본적 수비만 충실해도 팀 수비력 자체가 견고해지는 시스템을 만든다. 또한, 외곽수비력이 좋지 않은 외국인선수가 많았다.
국제무대는 전 포지션 장신화는 물론이고, 힘과 스피드, 테크닉을 겸비했다. 어느 것 하나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대표팀으로선 전원이 내, 외곽을 오가며 스위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밑바탕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트랩 디펜스 등 변형 전술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런데 KBL서 골밑 혹은 자유투 라인부근까지만 수비를 해본 국내 4~5번 선수들이 막상 대표팀에선 어려움을 겪는다. 빅맨 중 수비 이해도가 탁월한 김주성 정도를 제외하면 김종규 이종현 이승현 장재석 최진수 등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다.
7일 진천선수촌에서 만난 유재학 감독은 “스피드는 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뛰는 것과 자기 진영에서 수비 범위를 바꿔서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스텝을 놓는 요령부터 다르다. 유 감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키 큰 선수들에게 상대 발 빠른 가드 등 1~3번 선수들을 완벽하게 수비할 수 있는 요령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그런데 KBL은 외국인선수들이 있고, 신장과 기술이 비슷한 팀들만을 상대한다. 팀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농구를 숙달한다. 각 팀 에이스로 구성된 대표팀 멤버들이 수비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 없는 시스템. 김주성은 “결국 농구에서 움직임은 비슷하다. 처음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양동근도 “오히려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익히면 소속팀에 돌아가면 수비는 더 쉽다”라고 했다.
하지만, 유 감독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KBL에 익숙한 선수들이 대표팀 수비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팀과 외국인선수와 함께 리그 우승을 위한 소속팀의 수비 시스템이 완전히 같을 순 없다. 그러나 KBL 수비 시스템에 길들여진 선수들을 대표팀 수비 시스템에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은 분명 쉽지는 않다.
유 감독은 “양동근은 자신의 움직임뿐 아니라 팀 수비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 그러나 빅맨들은 수비하는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주성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빅맨이 무한 스위치와 트랩에 대한 경험과 스킬이 부족하다. 때문에 정작 대표팀이 국제무대서 살아남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1-3-1 변형 지역수비 등 세련된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팀이 봄에 소집되면 항상 이 간극을 메우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속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개인의 노력
대표팀 최고참이자 간판 빅맨 김주성은 10년 넘게 국제대회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보다 더 높고 강한 매치업 상대에게 깨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얻으면서 KBL에서 요구하는 수비 테크닉 그 이상의 것을 체득했다. 김주성은 이를 소속팀 동부에서 최대한 활용했다. 팀 시스템과의 괴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스킬을 최대한 활용했고 녹여냈다. 소속팀과 대표팀의 수비 딜레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 케이스다. 물론 동부가 전통적으로 김주성 수비력 중심의 팀이었다는 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세를 갖는 선수가 많아져야 한국농구가 KBL과 대표팀 사이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유 감독은 “나는 대표팀서 시키는 훈련을 모비스에서도 그대로 시킨다. 결국 본인들이 노력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했다.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익힌 각종 수비전술을 소속팀서 녹여내려는 노력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유 감독은 “습관이다. 대표팀서 익힌 수비전술을 소속팀에서도 습관화하면 본인도 도움이 되고 팀도 결국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수비뿐 아니다. 국제대회서 민감하게 지적되는 트레블링과 캐링 더 볼 등도 소속팀에서도 의식적으로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양동근과 김선형은 “대표팀서 조심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난해 아시아선수권서 의외로 많이 지적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유 감독은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국제심판들은 최근 진천 연습경기서도 선수들에게 수 차례 주의를 줬다.

▲ 행정의 변화
유 감독은 평가전 직후 “KBL은 몸싸움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FIBA룰과 KBL룰의 몸싸움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다. 파울 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FIBA는 볼 없는 위크사이드에서 몸싸움을 대부분 허용한다. 그러나 KBL은 파울 콜이 잦다. 1대1 수비에서도 KBL 파울 콜은 잦다. KBL 파울 콜에 지배된 선수들이 국제대회서 몸 싸움을 사릴 수밖에 없다. 결국 힘과 테크닉, 전투적이고 지능적 몸싸움 스킬을 가진 중국, 이란 등에도 무너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딜레마를 단순히 선수들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프로농구가 유의미한 발전을 하려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KBL로 이식돼야 한다. 유 감독은 “근본적으로 KBL도 FIBA룰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야 KBL도 세계 속에서 질 좋은 리그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지금 KBL은 철저히 그들만의 농구, 그들만의 테크닉에 갇혔다. 유 감독이 그 간극을 좁히려고 대표팀 소집 때마다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유 감독 역시 국내에서 가장 유능한 농구 지도자일뿐, 신은 아니다. 유 감독이 한국농구 시스템의 문제를 100% 바꿀 수는 없다.
결국 KBL부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룰을 바꿔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수비 전술의 딜레마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파울 콜의 문제, 바이얼레이션의 문제는 충분히 인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심판들과 지도자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 놓고 있어선 절대로 안 될 문제다.
[남자농구대표팀 연습경기 장면. 사진 = 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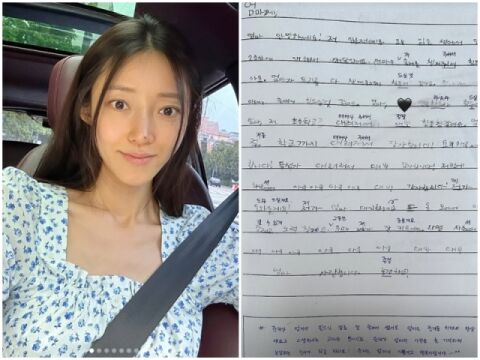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