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여기는 칸]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 英 복지제도 비판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프랑스 칸 곽명동 기자]올해 80살이 된 세계적 거장 켄 로치 감독은 2년 전 칸 영화제에서 ‘지미스 홀’이 은퇴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하층민의 삶은 그에게 다시 메가폰을 들게 했다. 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작에 오른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영국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고 잊혀져가는 중년 노동자의 삶을 리얼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목수다. 재취업이 안되면 당장 굶어야 할 판이다.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고 인터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보지만, 병이 나을 때까지 취업할 수 없다는 의사의 권고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빚만 쌓여간다. 어느날 우연히 만난 두 아이의 싱글맘 케이티(헤일리 스콰이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 작은 힘이나마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한다.

켄 로치 감독은 ‘칼라 송’ ‘내 이름은 조’ ‘빵과 장미’ ‘보리밭은 흔드는 바람’ ‘자유로운 세계’ ‘엔젤스 셰어’ ‘지미스 홀’에서 호흡을 맞춘 폴 래버티가 오랜 기간 취재를 거쳐 완성한 각본을 바탕으로 심근경색으로 실업자가 된 59살 목수가 영국 노동 시스템의 관료주의에 쓰러져가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그려낸다.
오프닝 타이틀이 올라올 때, 다니엘이 의료 관계자와 통화화는 과정부터 그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시스템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업자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관료들은 마치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메시지처럼 공허하게 다가온다.
다니엘은 벽에 막힐 때마다 ‘터무니 없는(ridiculous)’이라는 말을 내뱉는다. 터무니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실존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진다.
켄 로치 감독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춘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즐겨 다뤘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몸이 아픈 중년의 노동자와 오갈데 없는 싱글맘의 아픈 사연에 집중하며 빈부격차가 야기한 병폐를 응시한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가운데 가장 쓸쓸한 작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쓸쓸함 속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살아 숨쉰다. 켄 로치 감독은 인간은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주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인간이고, 시민이다.
제69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사진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스틸컷]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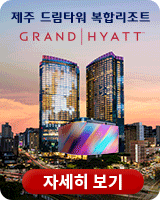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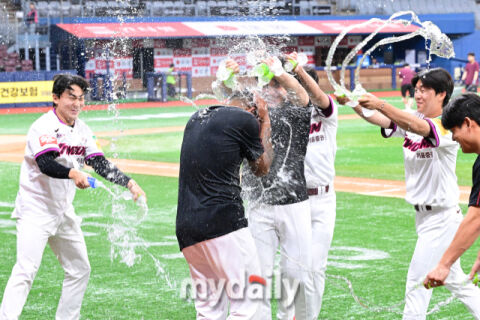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