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곽명동의 씨네톡]‘나, 다니엘 블레이크’ 관료주의를 저격하라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관료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민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룰에 국민을 끼워넣고 맞지 않으면 추방시킨다. 관료가 살아가는 법이다.
솜씨 좋은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일을 쉬게 된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노동 적합’ 판정을 내려 ‘질병 수당’이 아닌 ‘구직 수당’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인터넷이 아닌 연필 세대인 그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닌다. 그는 재취업 연락을 받아도 병 때문에 일할 수 없다. 각종 세금에 부족한 생활비를 내기위해 급기야 모든 가구를 내다판다. 다니엘 블레이크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된다.
이 영화의 관료주의는 카프카의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밀란 쿤데라는 카프카 작품 속 관료주의를 “복종과 기계와 추상의 세계”라고 갈파했다.

그들은 자발성도 창의성도 행동의 자유가 없는 ‘복종의 세계’에서 일한다. 관료주의는 활동의 목적과 전망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기계의 세계’이고, 익명의 사람들이나 서류하고만 관계하고 있는 ‘추상의 세계’이다.
고용센터의 한 여직원은 다니엘 블레이크의 딱한 사정을 보고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상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도와주지 말라고 명령한다. 복종의 세계다.
극 초반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상담원은 양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배변장애가 있는지, 손가락을 움직여 긴급전화를 누를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 정작 심장질환은 물어보지 않는다. 매뉴얼대로 질문하는 기계의 세계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이력서를 쓰지 못하는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관료는 ‘제재 대상’이라고 통보한다. 이력서를 컴퓨터가 아니라 필기도구로 썼다는 게 이유다. 다니엘 블레이크의 정체성은 서류 한 장으로 평가 받는다. 추상의 세계다.
카프카는 밀레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청은 멍청한 기관이 아니예요. 멍청함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적인 것에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라고 통찰했다.
관청은 복종, 기계, 추상의 세계에서 ‘환상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리얼한 세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환상의 미로에 갇혀 서서히 질식한다.
온갖 모순이 중첩된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자세로 싸운다. 싱글맘 케이티와 거리의 시민들은 그의 싸움을 지지한다.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모든 시민이 관료주의의 덫에 걸려 있다. 관료주의에 맞서는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그 투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
[사진 제공 = 영화사 진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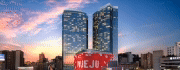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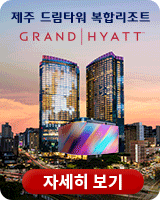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