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곽명동의 씨네톡]‘에곤 쉴레:욕망이 그린 그림’, 청춘의 사신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디터 베르너 감독의 ‘에곤 쉴레:욕망이 그린 그림’이 예술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4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사 측에 따르면, 대다수 관객은 20대 여성이다. ‘오스트리아의 강동원’으로 불리는 노아 자베드라의 그림같은 비주얼도 흥행 요인이다. 그러나 단지 배우가 잘 생겼다는 이유 만으로 ‘아트버스터’가 탄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단 한 차례의 미술전도 열리지 않았던 화가의 전기영화에 왜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몰리는걸까.
지금 이 시대 청춘의 화두는 ‘불안’이다. ‘헬조선’의 신음 속에서 누가 희망과 낙관을 노래하겠는가.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은 청춘을 옥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실신한다. 눅눅한 지하에 갇힌 기분이다. 출구가 과연 열릴까하는 기대가 포기로 바뀐지 오래다.
1988년 11월 빈에서 에곤 쉴레의 ‘죽음과 소녀’를 본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도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서승, 서준식 두 형은 1971년 유학생 간첩사건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군사정권에서 고문 끝에 사형선고를 받아 20년 가까이 복역 중이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옥바라지 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뜨신 직후였고, 나 자신은 가족도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투쟁, 이루지 못한 꿈, 도중에 끝나 버린 사랑, 발버둥치면 칠수록 서로 상처밖에 주지 않는 인간관계, 구덩이 밑바닥 같은 고독과 우울, 그런 것뿐이었다… 죽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죽음이 항상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 그림 앞에 섰을 때 내가 격렬한 전율에 사로잡힌 것은 반드시 추위 탓만은 아니었다.”(<청춘의 사신> 중에서)
서경식을 ‘격렬한 전율’에 사로잡히게 했던 ‘죽음과 소녀’의 에곤 쉴레 역시 불안과 죽음의 그림자에 붙들려 살았다. 1900년대 초반 합스부르크 왕가는 쇠퇴로 내몰렸다. 에곤 쉴레가 스페인 독감으로 28살의 나이로 사망했던 1918년 10월 31일,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거대한 패전국의 영토를 축소하기 위해 빈에 모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여러 개의 나라로 해체됐다. 그 당시 예술가들은 몰락, 죽음, 재난의 악몽 속에 몸을 떨었다. 에곤 쉴레는 ‘죽음과 소녀’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신(死神)’으로 형상화했다.

쓰러져가는 제국은 청춘에게 ‘안정’을 강요했다. 에곤 쉴레는 보수적인 화단에 반기를 들었다. 빈 예술아카데미를 뛰쳐나와 ‘신 예술가그룹’을 결성했다. 기괴하면서도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내세운 그림으로 독창적 화풍을 구축했다.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예술가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절망과 죽음의 극단적 분위기 속에서도 에곤 쉴레는 창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경식 역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992년 교양 베스트셀러 <나의 서양미술 순례>를 펴냈다. 암울했던 시절, 쉼 없이 그림 공부를 하며 혹독한 현실을 견딘 끝에 최고의 에세이스트가 됐다.

에곤 쉴레는 미성년자를 누드화로 그렸다는 혐의을 받고 20여일간 구금된 적이 있다. 억울한 누명이었다. 그는 구치소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나의 예술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견뎌내겠다.”
이러한 예술적 자세가 그를 최고로 만들었다. 지금의 20대 관객도 그의 예술혼에 공감했을 것이다.
[사진 제공 = 씨네큐브, 창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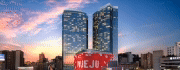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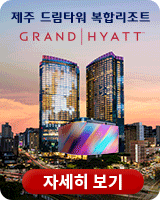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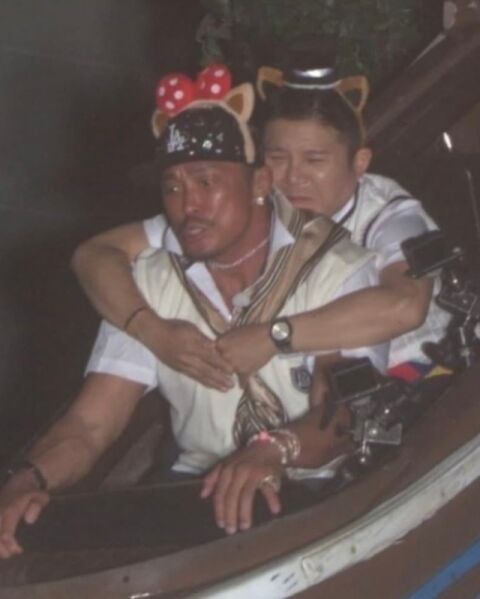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