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우올림픽 결산] 한국 10-10 실패, 의미와 교훈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결국 10(금메달)-10(순위)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은 리우올림픽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4회 연속 톱10 진입에 성공했으나 금메달 10개는 채우지 못했다. 한국이 내세운 10-10은 절반의 성공이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
한국이 한 자릿수 금메달을 따낸 건 2004년 아테네올림픽(9개) 이후 처음이다. 총 메달 개수(21개)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33개) 이후 최소.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서 연이어 13개의 금메달, 총 31개, 28개의 메달을 따내며 7위, 5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한국은 리우올림픽에 선수 203명, 임원 112명 등 총 315명을 파견했다. 1984년 LA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다. 올림픽을 준비할 때부터 삐걱거렸다. 수영 박태환이 약물파동 끝에 뒤늦게 출전이 확정됐고, 준비부족을 드러내며 최악의 성적을 냈다. 체조 양학선은 부상으로 리우에 오지도 못했다. 구기 종목은 남자축구, 여자배구, 여자핸드볼, 여자하키 외에는 지역예선서 모조리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때문에 애당초 10-10이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실제 종목별 메달 획득 분포를 분석해보면 사상 최초로 전 종목 석권에 성공한 양궁(금4), 출전선수 전원 메달 획득에 성공한 태권도(금2, 동3) 정도를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종목이 없다. 세계랭킹 1위와 최상위 레벨의 실력자가 즐비한 유도와 레슬링은 노골드 수모를 맛봤다. 사격과 펜싱은 진종오의 3연패와 박상영의 깜짝 금메달로 선전했지만, 런던 대회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구기종목은 잇따라 쓴잔을 들이켰다. 전통의 효자종목 여자하키와 여자핸드볼은 조별리그서 탈락했고, 남자축구는 2회 연속 동메달, 여자배구는 2회 연속 4강 진입에 도전했으나 8강서 꿈을 접었다. 결국 구기종목은 1972년 뭔헨올림픽 이후 44년만에 노메달 수모를 겪었다.
대회 막판 태권도 김소희와 오혜리가 연이어 금맥을 캤고, 1900년 파리올림픽 이후 116년만에 부활한 여자골프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내며 페이스를 바짝 끌어올렸지만, 금메달 10개 대신 톱10 진입에 만족해야 했다. 태권도 차동민이 8강서 탈락하면서 한국의 10-10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사실 10-10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 올림픽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중요한 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및 관리 시스템이다. 박태환과 양학선이 메달에서 멀어지자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서 단 1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신체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사례만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중국이야 엄청난 인구 속에서 유망주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지만, 탄탄한 사회체육시스템 속에서 기초종목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약진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투기종목과 일부 구기종목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기초종목과 투기종목, 구기종목서 고루 메달을 따내며 6위에 올랐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투자가 일찌감치 리우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4년 뒤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서는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엘리트스포츠는 위기다. 일부 효자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현실에선 절대 스포츠 강국 지위를 꾸준히 지켜나갈 수 없다.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젠 정말 기초종목을 비롯한 전 종목서 유망주 육성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한국선수단. 사진 = 리우(브라질)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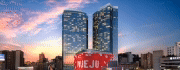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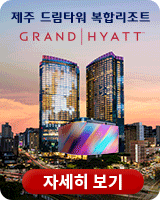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