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곽명동의 씨네톡]‘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사울의 아들’의 샤덴프로이데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한 명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는 어느날 6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그는 6년 동안 생전 모르는 남의 자식을 키웠다. 아이를 바꾼 간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 간호사는 법정에서 료타가 너무 부러워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떨궜다.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니 말이 되는가. 질투심에 샘이 나서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단지 영화일 뿐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간호사의 심리는 ‘샤덴프로이데’다. 피해를 뜻하는 ‘schaden’과 기쁨을 뜻하는 ‘freude’가 합쳐진 이 독일어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뜻한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쌤통’이다.
순간적으로 샤덴프로이데가 작동한 간호사는 아이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6년이 지나 죄책감에 진실을 털어놓는다). 잘 생기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료타의 삶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다. ‘네 자식을 잃고 남의 자식을 네 자식인줄 알고 키우는 고통을 겪어봐라’라는 쌤통 심리. 간호사의 샤덴프로이데는 료타의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할만한 범죄로 이어졌다.
그러나 타인의 악마같은 샤덴 프로이데에 료타는 흔들렸을 지언정, 무너지지 않았다. 세상이 왜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줬는지를 원망하지도, 간호사에게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두 아들을 모두 품는다.

또 한 명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영화 ‘사울의 아들’에서 사울(게자 뢰리히)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시체처리반 ‘존더코만도’로 일한다. 그는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숨지면 기계적으로 시체를 처리한다. 어느날 한 소년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소년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유대교 전통에 따라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목숨을 건 장례식을 준비한다.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히틀러의 샤덴 프로이데의 희생양이다(히틀러는 600만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샘통의 심리학>(현암사)를 쓴 심리학 교수 리처드 H. 스미스는 히틀러가 부러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질투는 샤덴 프로이데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갔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은 히틀러의 샤덴 프로이데로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1942년 유대인 말살을 결정한 반제 회의에 참석한 나치 수뇌부에게도 쌤통심리가 작용했다. 그들은 회의가 끝난 뒤 시가와 코냑을 즐겼다.
사울은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의 샤덴 프로이데가 야기한 지옥의 한 복판에서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다. 소년의 장례식은 비인간적인 나치에 맞서는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소년을 아들로 품어 그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은 참혹한 지옥을 견디고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사울의 행동을 겨우 짐작만 할 뿐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악한 본성, 샤덴프로이데가 있다. 대부분은 잠깐 느꼈다가 사라진다. 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히틀러처럼 될 수도 있다.
샤덴프로이데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불행에 즐거워하지 말고 공감을 느껴야한다. 링컨 대통령은 정치 인생 초반에 동료 의원을 조롱했다. 잘못을 깨달은 그는 이후부터 모욕과 조롱을 삼가고, 공감 능력을 발휘했다. 결국 그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 리처드 H. 스미스 교수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연설을 들려주며 샤덴프로이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진 제공 = 티캐스트, 그린나래미디어]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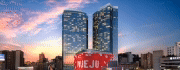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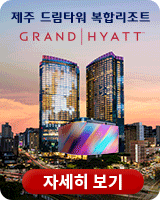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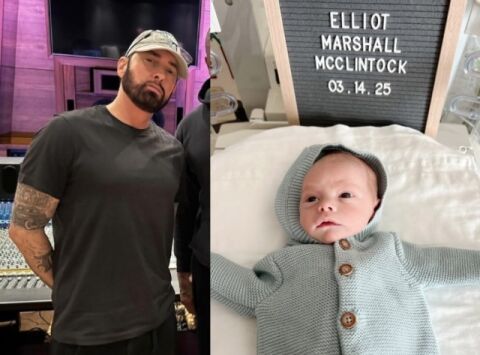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