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일본 비판과 ‘주전장’의 직격탄[곽명동의 씨네톡]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일본영화로는 1997년 ‘우나기’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 이후 21년 만이었다. 평소 일본인이 해외에서 선전하면 마치 자기 일인양 축전을 보냈던 아베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수상에는 침묵했다. 당시 할리우드 리포터는 일본에 비판적인 행보를 보였던 감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2차 대전 가해국으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사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2005년 후지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망각’을 통해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존재가 일본인의 내면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물었다. 앞서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헌법의 근본정신을 무시한 무모한 해석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일본은 2차 대전의 책임을 망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비단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통의 일본인도 자신들은 되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일과는 딴판이다. 독일은 가해자의 책임을 뼈저리게 실천하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도 나치 부역자를 찾아내, 그가 아무리 늙었더라도, 법정에 세워 법적 처벌을 내린다. 일본은 어떠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영화자서전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에서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한다.
“이를테면 제 어머니가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은 도쿄 대공습뿐이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타이완과 한국만으로 그쳤다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지금쯤은…" 하고 주눅 들지도 않고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명백하게 피해 감정밖에 없습니다. (중략) 개인의 수준이 이러니 당연히 일본사 전체도 그런 형태를 취하겠지요. '가해의 기억'은 없던 셈 치거나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정색하거나 불문에 부칩니다(152P).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과거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천황제 중심의 국가주의 체제였던 일본에 1945년 패전 뒤 들어온 민주주의는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라 연합국에게 강요받은 이념이었다고 했다. 군국주의를 실행한 경찰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당연히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청산되지 않고, 성찰되지 않은 역사는 언제나 망령을 부르기 마련이다. 최근 개봉한 미키 데자키 감독의 ‘주전장’은 아베 정권에 직격탄을 날린다. 이 영화는 아베 등 일본 우익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난징 대학살 등 과거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2차 대전 이전의 메이지유신 시대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는 성서의 ‘원죄’라고 했다. 그는 “‘가해’를 망각하기 쉬운 일본 국민성에 대한 쐐기로, 우리가 항상 죄의식을 자각하며 전후를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라고 되묻는다. 아베와 우익세력은 그 ‘원죄’를 지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보이콧 재팬’ 운동을 통해 그들의 원죄를 일깨워주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피해자였던 이웃국가 한국인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
[사진 = 마이데일리 DB, AFP/BB NEWS, 시네마 달]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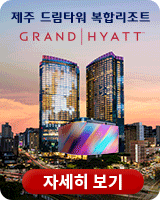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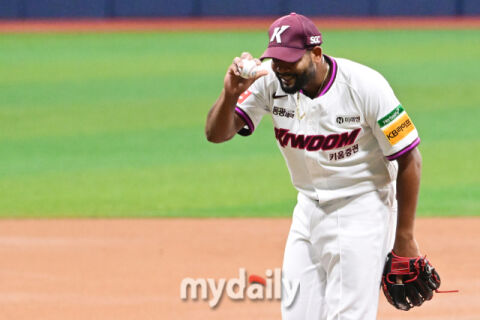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