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프로아마최강전, 프로팀 또 우승실패 어떻게 봐야 하나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2회 연속 프로팀들이 찬밥신세가 됐다.
제2회 프로아마최강전. 22일 고려대와 상무의 결승전만 남겨뒀다. 프로팀들은 2년 연속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초대대회서 상무가 전자랜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프로팀들은 아마추어에 우승의 영광을 내주게 됐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프로팀들이 왜 우승문턱에서 좌절하는 것일까.
▲ 프로팀들이 원한 9월 개최, 경기력은 좋아졌지만…
1회 대회 당시 프로팀들은 팬들과 언론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100% 전력을 기울일 수 없는 환경에서 치른 대회였다. 당시 프로농구 정규시즌 2라운드가 끝난 시점. 프로아마최강전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다. 부상 위험도 있으니 감독들은 주전들을 마음 놓고 내보내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맥 없는 경기가 속출했다.
프로팀들은 이 대회의 9월 개최를 강력하게 원했다. 결국 KBL과 대학농구연맹의 조율로 8월 개최가 성사됐다. KBL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8월에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최적의 시기다. 프로 팀들은 비 시즌. 100% 전력을 기울일 상황이 조성됐다. 실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프로팀들은 1회대회보다 훨씬 성실한 경기운영을 했다. 적어도 경기력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프로 팀들은 대학 중위권 전력의 팀을 손쉽게 물리쳤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었다. 프로 팀들은 오는 10월 12일 2013-2014시즌 개막을 앞두고 조직력을 다듬는 과정이다. 외국인선수들도 입국하지 않은 시점. 수비조직력이 엉성한 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 시즌 내내 대회를 소화했던, 특히 전력이 좋은 아마추어 팀들의 반란에 휘청거렸다. 프로팀들로선 딜레마다. 한 프로팀 관계자는 “대회 취지는 좋은데 이 대회만을 위해 몸 상태를 일찍 끌어올리는 것도 무리다. 어차피 프로농구 시즌이 끝나면 일정 기간은 몸을 돌보고 쉬어야 한다“라고 했다. 프로농구가 아닌 한 프로 팀들이 100%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이건 프로아마최강전의 경기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다.

▲ 너무나도 좋은 전력의 상무-고려대-경희대
프로팀들이 결정적으로 우승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팀은 상무다. 상무는 무늬만 아마추어다. 프로농구 MVP 출신 윤호영을 비롯해 2011-2012시즌 KGC인삼공사를 우승으로 이끈 백코드 듀오 박찬희와 이정현, 상무에서 기량이 일취월장한 오리온스 출신 슈터 허일영 등이 버티고 있다. 상무가 당장 외국인선수를 데리고 프로농구 정규시즌에 참가하면 우승전력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무는 종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프로농구 윈터리그 등의 준비를 위해 여름에도 꾸준히 몸을 만들어 놓는다. 당연히 시즌 내내 최고 수준의 조직력을 갖춰놓는다. 상무에서만 10년째 선수들을 지도하는 이훈재 감독의 시스템 농구는 매우 탄탄하다.
또 하나. 지난해 12월과는 달리 대학 양강 고려대와 경희대의 전력이 강하다. 대학 팀들도 지난해 12월은 대학리그가 끝난 시점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때문에 프로팀만큼이나 맥 없는 경기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학 6강은 9월 고스란히 대학리그 포스트시즌에 참가한다. 대학리그 정규시즌 이후 휴식기에 꾸준히 훈련을 소화해왔다. 오히려 프로팀보다 몸 컨디션은 더 좋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와 경희대의 경기력이 극대화됐다. 고려대와 경희대엔 체격조건이 좋은 선수가 많다. 테크닉은 덜 다듬어져도 개인 기량으로는 프로급을 능가하는 선수가 즐비하다. 고려대 이종현-이승현 더블 포스트 외에도 삼성생명 이호근 감독의 아들인 이동엽, 졸업반 포인트가드 박재현, 대표팀 슈터 문성곤, 청소년대표 출신의 김지후, 강상재, 최성모 등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가 많다.
경희대의 배수용과 한희원, 우띠롱 등도 김종규-김민구-두경민 3인방에 가렸을뿐, 대학 최정상급 기량을 자랑하거나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아마추어팀들이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이 대회가 열렸다. 고려대의 결승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단순히 전력이 100%가 아니었던 프로팀에 편승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다. 기본적인 기량이 좋은데다 훈련량도 프로 팀들보다 많은 시기였다. 전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 프로최강 모비스, 고려대가 아니라 이종현에게 졌다
프로팀들도 맥없이 그냥 패배한 건 아니었다. 프로농구 디펜딩챔피언 모비스는 경희대, 고려대 등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과 연이어 8강전과 준결승전서 만났다. 경희대엔 이겼고, 고려대엔 졌다. 하지만, 경기내용 상으론 사실상 두 팀을 압도했다. 특히 고려대전을 보면 리바운드에서 28-50으로 크게 밀렸지만, 단 1점 차로 패배했다. 공격 기회가 그만큼 적었음에도 조직적인 스크린 플레이에 이은 외곽슛 찬스를 만들었고, 문태영과 양동근이 2대2로 착실하게 점수를 만들었다. 함지훈도 수비와 리바운드에선 이종현에게 고전했지만, 공격에서만큼은 특유의 유연한 풋워크를 앞세워 어렵지 않게 점수를 만들었다.
수비조직력도 시즌 때만큼 최상은 아니었지만, 대학 팀들의 투박한 공격을 제어하기엔 무리가 없었다. 유재학 감독은 “김재훈 코치가 팀을 잘 만들어줬다. 훈련이 잘 됐다”라고 했다. 경희대와 고려대는 세련된 2대2, 스크린 등을 이용한 플레이보단 개개인의 운동능력을 활용한 1대1 공격에 치중했다. 효율성이 떨어졌다. 높이가 낮은 모비스로선 골밑에서 이종현과 김종규가 공을 잡으면 한 골을 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외곽슛을 철저히 봉쇄했고, 1-3-1 지역방어를 통해 빅맨들의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다. 경기를 지켜본 한 농구인은 “이종현의 원맨쇼가 아니었다면 고려대가 모비스에 완패한 게임이었다”라고 했다.
물론 대학 팀들은 프로팀에 비해 구력이 적다. 조직적인 플레이와 테크닉에선 당연히 프로가 한 수 위다. 대학 팀들은 좀 더 섬세한 테크닉을 끌어올려야 하고, 프로 팀들은 절대 높이를 갖춘 상대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대회 개최 시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도 섞였다. 프로팀의 2회 연속 최강전 우승 실패는 단순한 몇 가지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다.
[상무(위)-고려대(가운데)-경희대(아래) 선수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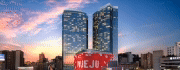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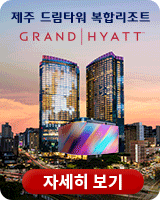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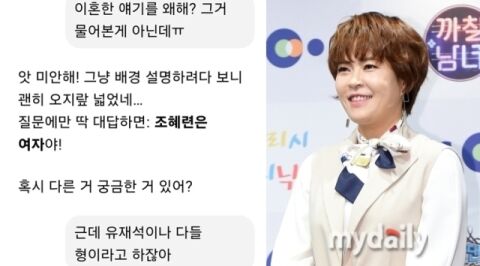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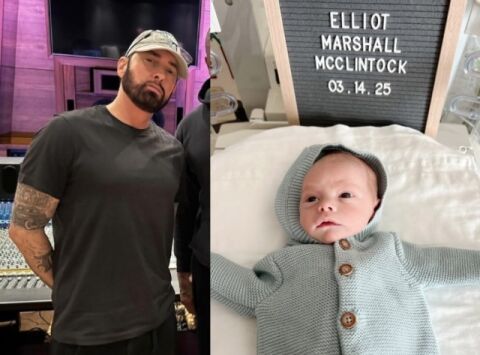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