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경성학교' 박보영 "강한 액션, 밤새 맞은 것 같아" (인터뷰)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박보영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모습들을 영화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에서 펼쳐 놓는다. 병약한 모습, 분노에 찬 모습 등이 한꺼번에 펼쳐진다. 생글생글 웃던 귀여운 국민 여동생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얼굴들이다.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은 비극으로 얼룩진 1938년, 외부와는 완벽히 단절된 경성의 기숙학교에 감춰져있던 77년 전의 비밀을 담아낸 영화다. 박보영이 사라진 소녀들을 보는 유일한 목격자 주란 역을 맡아 진폭이 큰 감정선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배경이 독특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시나리오 중 이런 시대적 배경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란이 수동적이 않고, 진취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게 좋았어요. 개인적 욕심으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출연하게 됐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배우로서 한 단계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영화는 중반부를 넘어서며 의외의 반전을 선사한다. 기존 박보영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법한 장면이 스크린에 펼쳐지는데, 박보영은 “관객분들이 영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촬영에 임했던 기억들을 꺼내 놨다.

“주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사실 모든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절충을 잘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디렉션을 해주셔도 스스로 이해가 안 가면 화면에 드러나거든요. 감독님은 속일 수 있어도 관객분들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란을 이해해야 했어요. 전 아직 큰 그림을 보고 감정선을 세세히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연출을 온전히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감정연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가장 고민이 됐던 건 주란이 각성하는 부분.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관객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지 고민을 거듭했다. 한 번도 안 봤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감독의 디렉션을 받고 ‘내가 보여주지 않은 얼굴은 어떤 걸까’ 고심했다. 그 결과 분노와 슬픔을 오가는 박보영의 모습들이 스크린에 담겼다. 여기에 후반부의 액션 신들은 액션 영화 못지않은 강도를 자랑한다.
“다치진 않았어요. ‘밤새 맞은 것 같은 몸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건 많이 느꼈죠. 와이어도 굉장히 많이 탔고요. 체력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걸 들으니 액션영화 느낌인데?) 촬영할 때는 더 그랬어요. (웃음)”
‘피끓는 청춘’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도 교복을 입은 박보영은 힘들지 않게 여고생 감정들을 되살렸다. 여기엔 극 중 등장하는 많은 여학생들도 한 몫을 했다. 촬영을 하며 학교 다닐 시절도 많이 떠올렸다.
“촬영장에 ‘까르르’ 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예전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다들 먹을 걸 싸와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많이 먹었다며 저녁을 안 먹는다고 했다가 저녁시간이 돼 또 먹고 후회하고 그랬죠. 수다도 많이 떨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촬영을 할 때는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 궁금한 것도, 신기한 것도 많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 친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고요.”

데뷔 9년차, 20대 중반이 된 박보영은 어느새 촬영 현장의 선배가 돼 있었다.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의 경우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다보니 특히 더 그랬다.
“후배가 늘어나 어색해요. 선배님이라고 하기에 ‘언니라고 불러줘’라고 했죠. 조금 더 있어야 안 어색할 것 같아요. 데뷔 9년차라니 저도 깜짝 놀라곤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님이 되려면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배우 박보영.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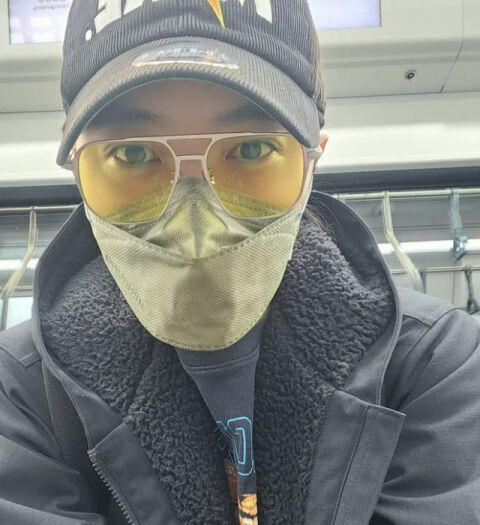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