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춘희막이’, 본처와 후처의 46년…그렇게 가족이 된다[MD리뷰]
- 0
- 가
- 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가 시작하면 세 대의 유모차가 나란히 서 있는 한적한 시골풍경이 펼쳐진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경운기 한 대가 느릿한 움직임으로 지나간다. 경운기가 프레임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세 대의 유모차 중 한 대가 조금씩 움직인다. 아마도 미세한 바람에 흔들렸을 것이다. 천천히 굴러가던 유모차는 논두렁으로 떨어진다.
이 쇼트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두 할머니의 삶을 끝까지 담아내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는 두 여인의 기구하고 얄궂지만 소박하고 정감있는 풍경을 보여주겠다는 것.

‘춘희막이’는 경북 영덕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큰댁 막이 할머니와 작은댁 춘희 할머니의 소박한 일상을 2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아낸 작품이다.
태풍과 홍역으로 두 아들을 잃었던 마흔 세 살의 최막이 씨는 조금은 모자란 처자를 데려오면 같이 살겠다 싶어 스물 네 살의 김춘희 씨를 데려온다. 김춘희 씨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당시 대부분의 씨받이가 아들을 낳으면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박혁지 감독은 본처와 후처의 관계를 단순한 호기심거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할머니들이 다 있네’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할머니들도 있다’라는 태도로 접근한다. 두 할머니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피해자다. 아들을 잃었다는 이유로 난생 처음 보는 여자와 한 집에 살아야하는 막이 할머니와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낯선 집에 들어가 ‘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했던 춘희 할머니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당한 채 살아야했던 한(恨) 많은 한국 여인사의 산증인이다.
그러나 박혁지 감독은 여성주의의 시선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가치로 다가선다. 막이 할머니는 당시 관행에 따라 춘희 할머니를 내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막이 할머니는 당대의 비인권적 질서에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반기를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내칠 수 없다는 기본 도리를 46년의 삶으로 실천했다.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은’ 막이 할머니와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춘희 할머니의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일상 풍경 속에 녹여냈다. 말없이 생선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고, 목욕 후에 옷매무새를 잡아주고, 외출할 때 가지런히 빗질을 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입가에 미소를 짓게한다. 한국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은 부드러우면서도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로 할머니들을 감싼다.

유모차로 시작하는 오프닝 신부터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빼어난 영상미로 채워졌다. 특히 두 할머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리창의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마루에 통으로 설치된 유리창에 비친 두 할머니는 서로가 질긴 인연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열 아홉 살의 나이차이를 감안하면, 두 할머니는 본처와 후처라는 사회적 관습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이자 딸이고, 언니이자 여동생이며,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그 사이 어디쯤에 막이와 춘희 할머니가 숨을 쉬고 있다.
영화는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돌아온 겨울에 끝난다. 박혁지 감독은 ‘계절의 환(環)’ 속에 두 할머니가 영원히 함께 하길 기원했을 것이다.
[사진 제공 = 하이하버픽처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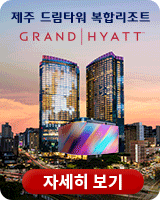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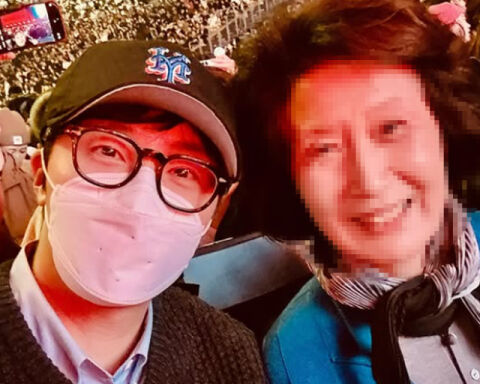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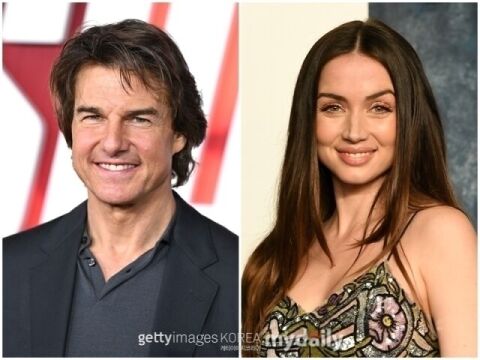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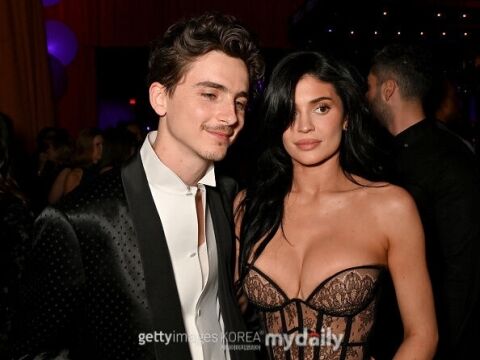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